 계획된 우연
계획된 우연

- 저자 :화탁지
- 출판사 :다반
- 출판년 :2023-06-21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4-11-28)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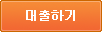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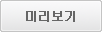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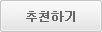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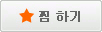
‘운명은 인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저자는 졸업 이후에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자신을 잊고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 늘 있었다. 타성에 떠밀리고 관성에 이끌려 가는 시간 속을 방황하다 마주친 칼 융의 저서를 읽은 후, ‘내 안에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융이 말하는 ‘공시성’의 사례였을까? 마침 그 시기를 스쳐가던 공교로운 우연 속에서 명리학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었던 순수한 의도였다. 보다 오래된 기억을 헤집어 보니 그 안에 자리한 ‘상처’가 계기였다. 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보다 더 세찬 비바람을 맞고 있는 사연들 중엔 오히려 자신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자에게 명리는 그런 성장을 가능케 해준 관계의 인문학이기도 했다.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세상은 내게 왜 이럴까? 무언가에 홀린 듯 했던 날들로 돌아보는 시간에 관한 명리학의 위로는 그런 것.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일이고, 꼭 당신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해명. 당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운명의 조합이 너를 그렇게 스쳐갔을 뿐이라고...
학창시절부터 틈틈이 글쓰기를 해왔고, 문학에 대한 동경도 있다는 저자의 명리학은, 합리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면서 한편으론 삶과 사람과 사랑에 대한 이해를 담은 문학이기도 하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저자는 졸업 이후에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자신을 잊고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 늘 있었다. 타성에 떠밀리고 관성에 이끌려 가는 시간 속을 방황하다 마주친 칼 융의 저서를 읽은 후, ‘내 안에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융이 말하는 ‘공시성’의 사례였을까? 마침 그 시기를 스쳐가던 공교로운 우연 속에서 명리학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었던 순수한 의도였다. 보다 오래된 기억을 헤집어 보니 그 안에 자리한 ‘상처’가 계기였다. 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보다 더 세찬 비바람을 맞고 있는 사연들 중엔 오히려 자신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자에게 명리는 그런 성장을 가능케 해준 관계의 인문학이기도 했다.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세상은 내게 왜 이럴까? 무언가에 홀린 듯 했던 날들로 돌아보는 시간에 관한 명리학의 위로는 그런 것.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일이고, 꼭 당신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해명. 당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운명의 조합이 너를 그렇게 스쳐갔을 뿐이라고...
학창시절부터 틈틈이 글쓰기를 해왔고, 문학에 대한 동경도 있다는 저자의 명리학은, 합리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면서 한편으론 삶과 사람과 사랑에 대한 이해를 담은 문학이기도 하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