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2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2

- 저자 :박지원
- 출판사 :e퍼플
- 출판년 :2018-07-01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1-23)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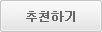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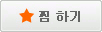
熱河日記 : 연암 박지원의 중국 여행기 2
21세기 현재의 ‘지금 여기’에서, ‘연암’과 같은 시각으로서 중국 땅을 살필 수 있는 방편은 아무래도 없을 듯하다.
우선, ‘연암’의 시각은 철저히 몸의 체험에 의하고 있다. 예컨대, ‘연암’은 직접 말을 타고서 여정을 꾸렸다. 나아가 하인이나 마부들은 제 발로 걸어서 그 여정을 소화해 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 도보로서 ‘열하일기’의 여정을 답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굳이 그러한 방식으로 여행하려는 자도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비행기를 타고 ‘심양’이나 ‘대련’쯤으로 가서, 줄곧 자동차쯤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북경’이나 ‘천진’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여정을 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연암’과 현대인의 시각차를 엿보이는 사실만은 아니다. 모름지기 문명의 변화는, 그 시대를 살아내는 인간존재들의 마음까지도 결정지어버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자동차나 비행기가 상용화된 시대를 살아내는 자는, 결코 말이나 수레가 상용화되던 시대를 살아내던 자의 감성에 접근할 수는 없다. 물론 굳이 그러해야 할 까닭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걷거나 말이나 수레를 타고서 그 땅의 풍취를 온 몸으로 체감하는 여행과,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식 이동수단 속에 몸을 감추고서 바깥의 대지와 차단된 채로 행해지는 여행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열하일기’와 ‘표해록’의 번역을 계획하면서, ‘타이베이’, ‘하노이’, ‘교토’ 등을 다녀왔다. 이는 모두 위의 원전들과 다소 연관이 있는 지역들이며, 번역작업에 보다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런데 그 여정들은 참으로 고독했고 지극히 여유로웠으며, 그럼으로써 ‘박지원’이나 ‘최부’의 감성에 좀 더 접근해보고자 했다.
이제 ‘열하일기’의 번역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열하일기’의 루트를 직접 여행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아마도 ‘열하일기’의 번역이 진행되는 동안,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수차례에 걸쳐 여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다시 여행을 나설 생각을 하면, 이내 설렌다. 하지만 그 설렘은 한없이 고독하며 지극히 여유로운 설렘이다. 고독하면서 여유롭다니. 이는 아주 현묘(玄妙)한 감정상태임이 자명하다. 여행길을 나서지 않는다면, 당최 체험할 수 없는 현묘함인 것이다.
그러한 현묘함으로서, ‘열하일기’를 번역하는 동안 필자는 늘 그 여행길에 있다. 얼굴 한 번 본적 없으며, 말 한 마디 나눈 적 없는 ‘연암’과 동행하며, 항상 그 여행길에 있다.
인간존재의 삶이란 다만 ‘지금 여기’의 상황일 따름이다. 물론 분명히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나 미래는, 죄다 ‘지금 여기’의 현재에 포괄될 따름이다. 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나 미래는 단지 인간존재의 인식 안에서만 작동하는 하나의 개념이거나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존재는 모름지기 항상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야만 한다. 과거라는 것의 누적된 결과로서 현재가 작동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재가 누적되어 미래가 작동할 것이다. 그런데 미래는 하나의 예측일 따름이며, 결코 실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컨대,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인간존재의 현재가 제아무리 미래에 근접하더라도, 그 미래는 이미 현재보다는 나중일 것이므로, 결국 그 미래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는 결코 궤변이 아니다.
더욱이 여기서 ‘웜-홀’이라거나 ‘다중 우주론’ 따위를 논변코자 함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쨌거나 인간존재로서 ‘지금 여기’의 현재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현재의 ‘지금 여기’의 상황에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중하는 방편 중 대표적인 것이라면, 아무래도 여행을 말해야만 할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대부분의 인간존재들은, 흔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행을 미룬다. 그러한 핑계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를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자식을 양육해야 한다거나, 건강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데 그러한 핑계를 앞세우다 보면 결국 여행길은 나설 수 없는 법이며, 그렇게 하루하루 쫓기며 살아내다 보면, 시나브로 늙음과 죽음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여행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여행의 자리에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 따위를 대체해도 무방하며, 그 외에 또 다른 실천적 가치 개념을 대입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고 하자. 그런데 그 고백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혹여 ‘이심전심(以心傳心)’이나 ‘심심상인(心心相印)’쯤을 말하고자 한다면, 다만 그런 말들은 당최 이러한 상황에 걸맞은 표현이 아니라고만 말해 두고 싶다.
인간존재의 삶이란 ‘지금 여기’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어떠한 실현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충분한 심사숙고가 선행되어야 함은 실로 자명한 노릇이다.
어쨌거나 어떤 방식의 여행이 모범답안일 수는 없다. 게다가 21세기에 굳이 ‘연암’의 방식을 좇아 걷거나 말을 탄다고 해서, 그 당시를 체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역사나 문화를 살필 때에는, 반드시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시공간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연암’의 시대가 나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1세기가 그 시대에 비해서 나은 것도 없다. 인간존재라면 누구라도 부득이하게 자기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을 억지로 벗어날 수 있는 방편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하일기’의 ‘속재필담’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이른바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새나오는 학문이니, 지금 향교나 서당에서, 그저 글을 읽기에만 힘쓸 뿐, 그 의미를 강론하지는 않으므로, 귀로는 똑똑히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아득하기만 한 것입니다.[是所謂口耳之學, 現今?塾之間, 慣是念書, 不曾講義, 故耳聞了了, 目視茫茫.]
그러니 입으로는 제자백가의 이론이 모두 술술 풀려 나오더라도, 손으로 글을 지어내려면 한 글자도 어려운 것입니다.[口宣則百家洋洋, 手寫則一字??.]”
무릇 대부분의 학문 활동은 귀로 듣는 것이 주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열하일기’에 따르면, 그러한 과정은 눈의 활동과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학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귀나 입에만 치우치지 않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귀와 입과 눈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체험을 통해서라야만 한다. 그러한 체험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면, 필자는 응당 여행을 말할 것이다.
여행이야말로 귀와 입과 눈이 동시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나아가 몸과 마음이 유기적이며 종합적으로 작동해야만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같은 곳에는 이러한 기술도 있다.
“귀에는 ‘대유산(大酉山)’과 ‘소유산(小酉山)’이라는 ‘이유’의 동굴 속에 천권의 책을 간직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눈으로는 ‘고무래 정’자도 보지 못 한답니다.[耳藏二酉, 眼無一丁.]
하늘에 글 모르는 신선은 없으며, 속세에는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는 법이지요.[天上無不識字神仙, 世間還有能言之鸚鵡.]”
제아무리 많은 책을 간직하고서 그것을 독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학문이 될 수 없다. 그저 독서하거나 암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는 한갓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공부를 했으며, 공부를 하고 있다면, 쉴 새 없이 지어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듯한 작품을 지어낼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지어내는 연습을 결코 멈추지 않을 때, 그 학문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늦은 나이에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어내는 연습을 결코 쉬지 않고 있다. 누군가를 흉내 내는 앵무새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아무리 소질을 지녔더라도, 처음부터 걸작이나 명작을 지어낼 수는 없는 법이다. ‘플라톤’의 발언처럼, 반드시 ‘미메시스(mimesis: 模倣)’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인간존재가 지닌 본래성이다.
그런 탓에 필자의 작품들이 간혹, 다소 기존의 작품을 흉내 낼 경우, 아주 별스런 비난을 해대는 자들을 본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저작을 찾아보려고 하면, 지어낸 것이 거의 없다. 자기는 전혀 지어내지 못 하면서, 다른 이의 저작에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것이다.
그러한 비난이 혹여 어떤 개인적인 반감에서 기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공부를 하려는 자라면, 그러한 비난을 일삼기보다는 스스로 지어내는 일에 매진하려는 마음이 요구된다.
예컨대, 필자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 그러한 캐릭터의 족속들을 참 많이 보았다. 그곳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려는 마음보다는, 잠시 허울 좋은 대학원이라는 시공간에서 삶의 고통을 피해보려는 자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치고 그럴 듯한 소논문 한 편 스스로 지어내는 자를 보지 못 했다. 그러면서 관점이 바뀌었다느니, 아직은 시기상조라느니, 갖은 핑계로 너스레를 떤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제 명의로 된 텍스트는 결국 지어내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자들 대부분은, 자기의 작품을 고뇌하며 지어내야 할 시간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곱씹는 것으로 소일하기 십상이다. 그러니 어느 세월에 자기의 관점이 생성될 수 있겠는가. 아니 한낱 앵무새 역할이라도 해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필자는, 대학원 시절에 참으로 많은 공부를 하였다지만, 늘 어쩌다가 내가 그런 곳에 머물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 이렇게 내 삶의 여행길에 있으니, 더없이 홀가분하다.
‘열하일기’의 시절은 말할 나위 없으며, 이는 지극히 고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직접 저작이 없다. ‘붓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가 모두 그러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경지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저 그렇다는 얘기다.
그만큼 자기의 작품을 스스로 지어내는 일은 어려운 법이다. 그러니 모름지기 공부하려는 자라면, 어떻게든 자기의 작품을 스스로 지어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릴없는 무작자(無作者)들의 경우라면, 어떻게든 자기의 작품을 지어내는 자들의 노력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시간에, 자잘한 습작이라도 지어내 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공부다운 공부일 것이다.
나아가 무언가를 흉내 내는 앵무새의 수준에라도 이르려고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수년을 대학원에 재학하고서도 소논문 한 편 지어내지 못 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학문이라고 판단하겠는가.
그리고 7월 15일의 여정에서는, ‘중국’의 산하를 본 ‘조선인’들의 반응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벼슬이 높은 자들은 섭섭한 표정으로 얼굴빛을 바꾸면서, 쉬이 이렇게 말한다.[上士則?然變色, 易容而言曰.]
“도무지 볼 것이 없더군.[都無可觀.]”
그래서 왜 아무런 볼 것이 없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何謂都無可觀, 曰.]
“황제가 머리를 깎았고, 장수와 재상과 대신들 모두가 머리를 깎았으며, 선비와 서민들까지도 모두 머리를 깎았다.[皇帝也?髮, 將相大臣百執事也?髮, 士庶人也?髮.]
비록 그 공덕이 ‘은나라’나 ‘주나라’와 같고, 그 부강함이 ‘진나라’나 ‘한나라’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아직껏 머리를 깎은 천자는 없었다.[雖功德?殷周, 富强邁秦漢, 自生民以來, 未有?髮之天子也.]
또한 비록 ‘육롱기’나 ‘이광지’의 학문이 있고, ‘위희’나 ‘왕완’이나 ‘왕사진’의 문장이 있고, ‘고염무’나 ‘주이준’의 박식함이 있다고 한들, 한번 머리를 깎으면 곧 ‘되놈’이고, ‘되놈’이면 곧 개나 양 같은 짐승이니, 우리가 그런 짐승들에게서 무슨 볼 것이 있겠는가.[雖有陸?其李光地之學問, 魏禧汪琬王士徵之文章, 顧炎武朱彛尊之博識, 一?髮則胡虜也, 胡虜則犬羊也, 吾於犬羊也何觀焉.]”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곧 으뜸가는 의리라고 주장하므로, 이야기하는 자도 잠잠하고, 듣는 자도 옷깃을 여민다.[此乃第一等義理也, 談者默然, 四座肅穆.]
이는 특히 벼슬이 다소 높은 자들의 반응인데, 그저 ‘청나라인’들의 변발 풍습을 무작정 억지스럽게 비하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논리는 참으로 천박하다. 머리를 깎으면 무조건 ‘되놈[胡虜]’이고, ‘되놈’이면 무작정 짐승이라는 것이다.
필자도 여러 해 전, 최상위의 교육기관에 부속된 어느 연구소에 재직하는 동안, 이와 동일한 용어로써 교묘히 필자의 주장을 비난하는 논문을 접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논문을 기술한 저자는 필자와 일면식은커녕 이름조차도 알지 못 하는 자였으며, 지금 역시도 그 이름 따위는 기억되지 않는다. 때문에 당시 필자로서는 당최 그 저의를 알 수 없었다.
나중에야 그것이, 당시 여러 이유로 은둔 중이던 필자의 행동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유발했던, 무조건적인 집단적 반감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쯤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그저 자기의 비위를 건드렸으며, 그러니 ‘되놈’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필자 역시, 그러한 짓을 하는 논문의 저자를 그저 한갓 ‘되놈’보다도 못 한 놈이라고만 치부해버렸으며,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그 저자의 논문이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니, 그 저자의 죽음 이후에도 그 기록은 남겨질 것이다.
다만 그 비난의 대상이 왜 ‘되놈’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대학원의 연구소나 학계를 떠나버렸으며, 오래지 않아 필자의 기억에서도 점차 희미해질 것이므로, 사실대로 밝혀지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듯하다. 이에,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이 지니는 부득이한 편면성을 늘 유념해야 한다는 생각도 아울러 되새기게 된다.
‘열하일기’의 한 대목을 번역하면서, 왜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연암’의 시대나 21세기나, 나름대로 학식이나 지위를 지녔다는 자들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쉬이 부화뇌동하는 작태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후문에 의하면, 그 자가 ‘중국’의 어느 명문대학에서 수학하였다고 하니, 필자로서는 그 기억이 더욱 허망하게만 여겨진다. 고작 시류를 좇아 이득이 될 만 한 일이라면, 그것이 한갓 소문에 불과할지라도 핏발을 세우며 무작정 비난하고 보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사리 공부한 결과인 것일까?
현재에 이르도록 필자의 주장들이 다소 파격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와 유사한 부류들은 여전히 익명의 무리를 지어 온갖 수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21세기의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의 후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같은 곳에서 ‘연암’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나와 같은 하류의 선비들은, ‘장자(莊子)’처럼 ‘중국’의 장관은 기와 조각에 있다고 말하며, 또한 똥 부스러기에도 있다고 말할 것이다.[余下士也, 曰壯觀在瓦礫, 曰壯觀在糞壤.]”
어쩌면 이것이, 정작 ‘연암’이 시대 안에서 외치고 싶었던 참소리일 것이다. 물론 ‘연암’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에 의한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은, ‘청나라’에서일망정 배울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기와 조각이나 똥 부스러기에 불과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쉬이 주장하기 어려운 지극히 실용주의적이며 실리주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연암’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장자’의 ‘지북유(知北遊)’편을 인용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지극히 비판적인 사유방식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모름지기 ‘한나라’ 독존유술(獨存儒術)의 전통을 집대성한 ‘주자(朱子)’를 가장 잘 신봉한 국가공동체가 바로 ‘조선’이다. 그럼에도 ‘연암’은 보란 듯이 ‘장자’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처럼 악독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또한 사람의 마음처럼 선량한 것도 없는 법이다. 그래서 ‘노자(老子)’는 ‘총욕약경(寵辱若驚)’을 말했던 것이다. ‘총욕약경’은 사랑받거나 모욕당하거나 죄다 놀란 듯이 반응하라는 뜻이다.
인간존재는 쉬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상대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으며, 자기를 모욕하는 상대에게는 악의를 갖는다. 이는비단 인간존재만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온갖 만물이 지닌 일종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차원의 보편성일 따름이다.
따라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좋아하고, 자기에게 해악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일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아가 적어도 인간존재로서 동물의 차원을 극복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응당 이득이 되거나 해악이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로서는, 그렇게 ‘총욕약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행이 배려하는 고독과 여유가 참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필자는 늘, 풍족한 관광이 아닌 긴박한 여행을 다니는 탓에, 그 과정은 실로 쪼들리며 고달프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선 여행은, 아주 고독하며 또한 아주 묘하게도 한없이 여유롭다.
여하튼, 학문이 귀와 입과 눈과, 나아가 몸과 마음의 동시적인 작용으로서 작동했을 때, 그것은 참된 학문일 수 있다.
예컨대, 동시대를 살아내는 인간존재일지라도, 그의 공부가 참되지 못 하다면, 그 결과는 국가나 민족은 물론이며, 인류의 거대한 고통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서, ‘최제우(崔濟愚: 1824~1864)’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의 경우를 거론할 수 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아낸 두 사람은, 모두 시대의 거대한 사상가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공부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최제우’는 민족 고유의 경천(敬天)사상을 바탕으로 유불선(儒彿仙)과 도참사상, 후천개벽사상 등을 종합하여 동학(東學)을 창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동학은 서학(西學)에 저항하기 위해 태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侍天主)’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후대 ‘최시형’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시천(人是天)’이나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그리고 ‘손병희’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은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존왕파(尊王派)로서,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인 사상가이다. 그는 ‘유수록(幽囚錄)’을 저술하여서 정한론(征韓論)이나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 등을 주창하였는데, 그것은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주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홋카이도’의 개척, ‘오키나와’의 일본 영토화, ‘조선’의 식민지화, ‘만주’, ‘타이완’, ‘필리핀’ 등의 점령을 주장하였고, 현재에 이르도록 일본 우익의 교조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동시대에 노도처럼 밀려드는 서양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생존하기 위하여 고뇌했던 두 사상가는, 많은 차이를 지닌 사상적 결과물을 생산한 것이다.
‘최제우’의 사상은 그 토대를 하늘이라는 천지자연에 둠으로써, 민족이나 국가는 물론이며, 나아가 항상 인류 그 자체와 우주까지도 사려(思慮)한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의 철저히 일본이라는 국가에만 몰두하며, 그 국가공동체를 위해 주변의 국가공동체들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아 점령하고자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과거에 전쟁에 미쳐 날뛰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의한 인류의 고통은 말할 나위 없으며, 그것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면서, 그들의 자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었다. 현실세계의 서민대중으로서는, 단지 그 대체세력들이 과거의 전쟁광(戰爭狂)들처럼 미쳐 날뛰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나마 다소 안도할 따름이다.
현대의 ‘대한민국’은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한 민족이면서도 분단되어 있는 ‘북한’의 문제도 있다. 게다가 여전히 과거 전쟁광의 시대를 은밀히 회고하는 ‘일본’도 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라도, 부득이하게 생존해야만 하는 것이, 인간존재의 삶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삶이다. 그러한 삶의 지향을 모색할 때, 지난날 시대로부터 앞서 간 사유방식을 지니고서 살아낸 한 여행자의 삶은, 현대의 우리에게 적잖은 지침이 되어준다.
어쨌거나 기껏해야 몇 십 년을 살아내는 인간존재로서, 아주 다양한 삶의 체험을 갖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한 번 몸과 마음에 익숙해져버린 것들을 변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더욱이 대부분의 인간존재들은 굳이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렇게 삶이 머뭇거릴 때, 여행은 새로운 열정을 유발시켜 준다는 사실만큼은 인식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열하일기’를 독서해 보면 익히 알 수 있겠지만, ‘연암’ 역시도 필자와 유사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 현재의 ‘지금 여기’에서, ‘연암’과 같은 시각으로서 중국 땅을 살필 수 있는 방편은 아무래도 없을 듯하다.
우선, ‘연암’의 시각은 철저히 몸의 체험에 의하고 있다. 예컨대, ‘연암’은 직접 말을 타고서 여정을 꾸렸다. 나아가 하인이나 마부들은 제 발로 걸어서 그 여정을 소화해 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 도보로서 ‘열하일기’의 여정을 답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굳이 그러한 방식으로 여행하려는 자도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비행기를 타고 ‘심양’이나 ‘대련’쯤으로 가서, 줄곧 자동차쯤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북경’이나 ‘천진’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여정을 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연암’과 현대인의 시각차를 엿보이는 사실만은 아니다. 모름지기 문명의 변화는, 그 시대를 살아내는 인간존재들의 마음까지도 결정지어버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자동차나 비행기가 상용화된 시대를 살아내는 자는, 결코 말이나 수레가 상용화되던 시대를 살아내던 자의 감성에 접근할 수는 없다. 물론 굳이 그러해야 할 까닭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걷거나 말이나 수레를 타고서 그 땅의 풍취를 온 몸으로 체감하는 여행과,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식 이동수단 속에 몸을 감추고서 바깥의 대지와 차단된 채로 행해지는 여행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열하일기’와 ‘표해록’의 번역을 계획하면서, ‘타이베이’, ‘하노이’, ‘교토’ 등을 다녀왔다. 이는 모두 위의 원전들과 다소 연관이 있는 지역들이며, 번역작업에 보다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런데 그 여정들은 참으로 고독했고 지극히 여유로웠으며, 그럼으로써 ‘박지원’이나 ‘최부’의 감성에 좀 더 접근해보고자 했다.
이제 ‘열하일기’의 번역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열하일기’의 루트를 직접 여행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아마도 ‘열하일기’의 번역이 진행되는 동안,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수차례에 걸쳐 여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다시 여행을 나설 생각을 하면, 이내 설렌다. 하지만 그 설렘은 한없이 고독하며 지극히 여유로운 설렘이다. 고독하면서 여유롭다니. 이는 아주 현묘(玄妙)한 감정상태임이 자명하다. 여행길을 나서지 않는다면, 당최 체험할 수 없는 현묘함인 것이다.
그러한 현묘함으로서, ‘열하일기’를 번역하는 동안 필자는 늘 그 여행길에 있다. 얼굴 한 번 본적 없으며, 말 한 마디 나눈 적 없는 ‘연암’과 동행하며, 항상 그 여행길에 있다.
인간존재의 삶이란 다만 ‘지금 여기’의 상황일 따름이다. 물론 분명히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나 미래는, 죄다 ‘지금 여기’의 현재에 포괄될 따름이다. 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나 미래는 단지 인간존재의 인식 안에서만 작동하는 하나의 개념이거나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존재는 모름지기 항상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야만 한다. 과거라는 것의 누적된 결과로서 현재가 작동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재가 누적되어 미래가 작동할 것이다. 그런데 미래는 하나의 예측일 따름이며, 결코 실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컨대,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인간존재의 현재가 제아무리 미래에 근접하더라도, 그 미래는 이미 현재보다는 나중일 것이므로, 결국 그 미래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는 결코 궤변이 아니다.
더욱이 여기서 ‘웜-홀’이라거나 ‘다중 우주론’ 따위를 논변코자 함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쨌거나 인간존재로서 ‘지금 여기’의 현재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현재의 ‘지금 여기’의 상황에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중하는 방편 중 대표적인 것이라면, 아무래도 여행을 말해야만 할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대부분의 인간존재들은, 흔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행을 미룬다. 그러한 핑계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를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자식을 양육해야 한다거나, 건강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데 그러한 핑계를 앞세우다 보면 결국 여행길은 나설 수 없는 법이며, 그렇게 하루하루 쫓기며 살아내다 보면, 시나브로 늙음과 죽음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여행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여행의 자리에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 따위를 대체해도 무방하며, 그 외에 또 다른 실천적 가치 개념을 대입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고 하자. 그런데 그 고백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혹여 ‘이심전심(以心傳心)’이나 ‘심심상인(心心相印)’쯤을 말하고자 한다면, 다만 그런 말들은 당최 이러한 상황에 걸맞은 표현이 아니라고만 말해 두고 싶다.
인간존재의 삶이란 ‘지금 여기’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어떠한 실현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충분한 심사숙고가 선행되어야 함은 실로 자명한 노릇이다.
어쨌거나 어떤 방식의 여행이 모범답안일 수는 없다. 게다가 21세기에 굳이 ‘연암’의 방식을 좇아 걷거나 말을 탄다고 해서, 그 당시를 체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역사나 문화를 살필 때에는, 반드시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시공간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연암’의 시대가 나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1세기가 그 시대에 비해서 나은 것도 없다. 인간존재라면 누구라도 부득이하게 자기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을 억지로 벗어날 수 있는 방편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하일기’의 ‘속재필담’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이른바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새나오는 학문이니, 지금 향교나 서당에서, 그저 글을 읽기에만 힘쓸 뿐, 그 의미를 강론하지는 않으므로, 귀로는 똑똑히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아득하기만 한 것입니다.[是所謂口耳之學, 現今?塾之間, 慣是念書, 不曾講義, 故耳聞了了, 目視茫茫.]
그러니 입으로는 제자백가의 이론이 모두 술술 풀려 나오더라도, 손으로 글을 지어내려면 한 글자도 어려운 것입니다.[口宣則百家洋洋, 手寫則一字??.]”
무릇 대부분의 학문 활동은 귀로 듣는 것이 주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열하일기’에 따르면, 그러한 과정은 눈의 활동과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학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귀나 입에만 치우치지 않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귀와 입과 눈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체험을 통해서라야만 한다. 그러한 체험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면, 필자는 응당 여행을 말할 것이다.
여행이야말로 귀와 입과 눈이 동시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나아가 몸과 마음이 유기적이며 종합적으로 작동해야만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같은 곳에는 이러한 기술도 있다.
“귀에는 ‘대유산(大酉山)’과 ‘소유산(小酉山)’이라는 ‘이유’의 동굴 속에 천권의 책을 간직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눈으로는 ‘고무래 정’자도 보지 못 한답니다.[耳藏二酉, 眼無一丁.]
하늘에 글 모르는 신선은 없으며, 속세에는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는 법이지요.[天上無不識字神仙, 世間還有能言之鸚鵡.]”
제아무리 많은 책을 간직하고서 그것을 독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학문이 될 수 없다. 그저 독서하거나 암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는 한갓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공부를 했으며, 공부를 하고 있다면, 쉴 새 없이 지어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듯한 작품을 지어낼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지어내는 연습을 결코 멈추지 않을 때, 그 학문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늦은 나이에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어내는 연습을 결코 쉬지 않고 있다. 누군가를 흉내 내는 앵무새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아무리 소질을 지녔더라도, 처음부터 걸작이나 명작을 지어낼 수는 없는 법이다. ‘플라톤’의 발언처럼, 반드시 ‘미메시스(mimesis: 模倣)’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인간존재가 지닌 본래성이다.
그런 탓에 필자의 작품들이 간혹, 다소 기존의 작품을 흉내 낼 경우, 아주 별스런 비난을 해대는 자들을 본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저작을 찾아보려고 하면, 지어낸 것이 거의 없다. 자기는 전혀 지어내지 못 하면서, 다른 이의 저작에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것이다.
그러한 비난이 혹여 어떤 개인적인 반감에서 기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공부를 하려는 자라면, 그러한 비난을 일삼기보다는 스스로 지어내는 일에 매진하려는 마음이 요구된다.
예컨대, 필자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 그러한 캐릭터의 족속들을 참 많이 보았다. 그곳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려는 마음보다는, 잠시 허울 좋은 대학원이라는 시공간에서 삶의 고통을 피해보려는 자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치고 그럴 듯한 소논문 한 편 스스로 지어내는 자를 보지 못 했다. 그러면서 관점이 바뀌었다느니, 아직은 시기상조라느니, 갖은 핑계로 너스레를 떤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제 명의로 된 텍스트는 결국 지어내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자들 대부분은, 자기의 작품을 고뇌하며 지어내야 할 시간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곱씹는 것으로 소일하기 십상이다. 그러니 어느 세월에 자기의 관점이 생성될 수 있겠는가. 아니 한낱 앵무새 역할이라도 해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필자는, 대학원 시절에 참으로 많은 공부를 하였다지만, 늘 어쩌다가 내가 그런 곳에 머물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 이렇게 내 삶의 여행길에 있으니, 더없이 홀가분하다.
‘열하일기’의 시절은 말할 나위 없으며, 이는 지극히 고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직접 저작이 없다. ‘붓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가 모두 그러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경지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저 그렇다는 얘기다.
그만큼 자기의 작품을 스스로 지어내는 일은 어려운 법이다. 그러니 모름지기 공부하려는 자라면, 어떻게든 자기의 작품을 스스로 지어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릴없는 무작자(無作者)들의 경우라면, 어떻게든 자기의 작품을 지어내는 자들의 노력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시간에, 자잘한 습작이라도 지어내 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공부다운 공부일 것이다.
나아가 무언가를 흉내 내는 앵무새의 수준에라도 이르려고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수년을 대학원에 재학하고서도 소논문 한 편 지어내지 못 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학문이라고 판단하겠는가.
그리고 7월 15일의 여정에서는, ‘중국’의 산하를 본 ‘조선인’들의 반응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벼슬이 높은 자들은 섭섭한 표정으로 얼굴빛을 바꾸면서, 쉬이 이렇게 말한다.[上士則?然變色, 易容而言曰.]
“도무지 볼 것이 없더군.[都無可觀.]”
그래서 왜 아무런 볼 것이 없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何謂都無可觀, 曰.]
“황제가 머리를 깎았고, 장수와 재상과 대신들 모두가 머리를 깎았으며, 선비와 서민들까지도 모두 머리를 깎았다.[皇帝也?髮, 將相大臣百執事也?髮, 士庶人也?髮.]
비록 그 공덕이 ‘은나라’나 ‘주나라’와 같고, 그 부강함이 ‘진나라’나 ‘한나라’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아직껏 머리를 깎은 천자는 없었다.[雖功德?殷周, 富强邁秦漢, 自生民以來, 未有?髮之天子也.]
또한 비록 ‘육롱기’나 ‘이광지’의 학문이 있고, ‘위희’나 ‘왕완’이나 ‘왕사진’의 문장이 있고, ‘고염무’나 ‘주이준’의 박식함이 있다고 한들, 한번 머리를 깎으면 곧 ‘되놈’이고, ‘되놈’이면 곧 개나 양 같은 짐승이니, 우리가 그런 짐승들에게서 무슨 볼 것이 있겠는가.[雖有陸?其李光地之學問, 魏禧汪琬王士徵之文章, 顧炎武朱彛尊之博識, 一?髮則胡虜也, 胡虜則犬羊也, 吾於犬羊也何觀焉.]”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곧 으뜸가는 의리라고 주장하므로, 이야기하는 자도 잠잠하고, 듣는 자도 옷깃을 여민다.[此乃第一等義理也, 談者默然, 四座肅穆.]
이는 특히 벼슬이 다소 높은 자들의 반응인데, 그저 ‘청나라인’들의 변발 풍습을 무작정 억지스럽게 비하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논리는 참으로 천박하다. 머리를 깎으면 무조건 ‘되놈[胡虜]’이고, ‘되놈’이면 무작정 짐승이라는 것이다.
필자도 여러 해 전, 최상위의 교육기관에 부속된 어느 연구소에 재직하는 동안, 이와 동일한 용어로써 교묘히 필자의 주장을 비난하는 논문을 접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논문을 기술한 저자는 필자와 일면식은커녕 이름조차도 알지 못 하는 자였으며, 지금 역시도 그 이름 따위는 기억되지 않는다. 때문에 당시 필자로서는 당최 그 저의를 알 수 없었다.
나중에야 그것이, 당시 여러 이유로 은둔 중이던 필자의 행동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유발했던, 무조건적인 집단적 반감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쯤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그저 자기의 비위를 건드렸으며, 그러니 ‘되놈’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필자 역시, 그러한 짓을 하는 논문의 저자를 그저 한갓 ‘되놈’보다도 못 한 놈이라고만 치부해버렸으며,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그 저자의 논문이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니, 그 저자의 죽음 이후에도 그 기록은 남겨질 것이다.
다만 그 비난의 대상이 왜 ‘되놈’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대학원의 연구소나 학계를 떠나버렸으며, 오래지 않아 필자의 기억에서도 점차 희미해질 것이므로, 사실대로 밝혀지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듯하다. 이에,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이 지니는 부득이한 편면성을 늘 유념해야 한다는 생각도 아울러 되새기게 된다.
‘열하일기’의 한 대목을 번역하면서, 왜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연암’의 시대나 21세기나, 나름대로 학식이나 지위를 지녔다는 자들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쉬이 부화뇌동하는 작태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후문에 의하면, 그 자가 ‘중국’의 어느 명문대학에서 수학하였다고 하니, 필자로서는 그 기억이 더욱 허망하게만 여겨진다. 고작 시류를 좇아 이득이 될 만 한 일이라면, 그것이 한갓 소문에 불과할지라도 핏발을 세우며 무작정 비난하고 보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사리 공부한 결과인 것일까?
현재에 이르도록 필자의 주장들이 다소 파격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와 유사한 부류들은 여전히 익명의 무리를 지어 온갖 수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21세기의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의 후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같은 곳에서 ‘연암’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나와 같은 하류의 선비들은, ‘장자(莊子)’처럼 ‘중국’의 장관은 기와 조각에 있다고 말하며, 또한 똥 부스러기에도 있다고 말할 것이다.[余下士也, 曰壯觀在瓦礫, 曰壯觀在糞壤.]”
어쩌면 이것이, 정작 ‘연암’이 시대 안에서 외치고 싶었던 참소리일 것이다. 물론 ‘연암’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에 의한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은, ‘청나라’에서일망정 배울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기와 조각이나 똥 부스러기에 불과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쉬이 주장하기 어려운 지극히 실용주의적이며 실리주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연암’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장자’의 ‘지북유(知北遊)’편을 인용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지극히 비판적인 사유방식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모름지기 ‘한나라’ 독존유술(獨存儒術)의 전통을 집대성한 ‘주자(朱子)’를 가장 잘 신봉한 국가공동체가 바로 ‘조선’이다. 그럼에도 ‘연암’은 보란 듯이 ‘장자’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처럼 악독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또한 사람의 마음처럼 선량한 것도 없는 법이다. 그래서 ‘노자(老子)’는 ‘총욕약경(寵辱若驚)’을 말했던 것이다. ‘총욕약경’은 사랑받거나 모욕당하거나 죄다 놀란 듯이 반응하라는 뜻이다.
인간존재는 쉬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상대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으며, 자기를 모욕하는 상대에게는 악의를 갖는다. 이는비단 인간존재만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온갖 만물이 지닌 일종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차원의 보편성일 따름이다.
따라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좋아하고, 자기에게 해악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일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아가 적어도 인간존재로서 동물의 차원을 극복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응당 이득이 되거나 해악이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로서는, 그렇게 ‘총욕약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행이 배려하는 고독과 여유가 참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필자는 늘, 풍족한 관광이 아닌 긴박한 여행을 다니는 탓에, 그 과정은 실로 쪼들리며 고달프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선 여행은, 아주 고독하며 또한 아주 묘하게도 한없이 여유롭다.
여하튼, 학문이 귀와 입과 눈과, 나아가 몸과 마음의 동시적인 작용으로서 작동했을 때, 그것은 참된 학문일 수 있다.
예컨대, 동시대를 살아내는 인간존재일지라도, 그의 공부가 참되지 못 하다면, 그 결과는 국가나 민족은 물론이며, 인류의 거대한 고통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서, ‘최제우(崔濟愚: 1824~1864)’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의 경우를 거론할 수 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아낸 두 사람은, 모두 시대의 거대한 사상가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공부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최제우’는 민족 고유의 경천(敬天)사상을 바탕으로 유불선(儒彿仙)과 도참사상, 후천개벽사상 등을 종합하여 동학(東學)을 창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동학은 서학(西學)에 저항하기 위해 태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侍天主)’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후대 ‘최시형’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시천(人是天)’이나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그리고 ‘손병희’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은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존왕파(尊王派)로서,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인 사상가이다. 그는 ‘유수록(幽囚錄)’을 저술하여서 정한론(征韓論)이나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 등을 주창하였는데, 그것은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주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홋카이도’의 개척, ‘오키나와’의 일본 영토화, ‘조선’의 식민지화, ‘만주’, ‘타이완’, ‘필리핀’ 등의 점령을 주장하였고, 현재에 이르도록 일본 우익의 교조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동시대에 노도처럼 밀려드는 서양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생존하기 위하여 고뇌했던 두 사상가는, 많은 차이를 지닌 사상적 결과물을 생산한 것이다.
‘최제우’의 사상은 그 토대를 하늘이라는 천지자연에 둠으로써, 민족이나 국가는 물론이며, 나아가 항상 인류 그 자체와 우주까지도 사려(思慮)한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의 철저히 일본이라는 국가에만 몰두하며, 그 국가공동체를 위해 주변의 국가공동체들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아 점령하고자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과거에 전쟁에 미쳐 날뛰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의한 인류의 고통은 말할 나위 없으며, 그것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면서, 그들의 자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었다. 현실세계의 서민대중으로서는, 단지 그 대체세력들이 과거의 전쟁광(戰爭狂)들처럼 미쳐 날뛰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나마 다소 안도할 따름이다.
현대의 ‘대한민국’은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한 민족이면서도 분단되어 있는 ‘북한’의 문제도 있다. 게다가 여전히 과거 전쟁광의 시대를 은밀히 회고하는 ‘일본’도 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라도, 부득이하게 생존해야만 하는 것이, 인간존재의 삶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삶이다. 그러한 삶의 지향을 모색할 때, 지난날 시대로부터 앞서 간 사유방식을 지니고서 살아낸 한 여행자의 삶은, 현대의 우리에게 적잖은 지침이 되어준다.
어쨌거나 기껏해야 몇 십 년을 살아내는 인간존재로서, 아주 다양한 삶의 체험을 갖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한 번 몸과 마음에 익숙해져버린 것들을 변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더욱이 대부분의 인간존재들은 굳이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렇게 삶이 머뭇거릴 때, 여행은 새로운 열정을 유발시켜 준다는 사실만큼은 인식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열하일기’를 독서해 보면 익히 알 수 있겠지만, ‘연암’ 역시도 필자와 유사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