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서

- 저자 :이낙원
- 출판사 :들녘
- 출판년 :2018-02-28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8-21)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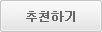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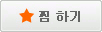
삶과 죽음이 철저히 분리된 시대,
회피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커져간다.
지금이야말로 잠시 멈춰 서서
서로의 존재를 감싸 안아야 하는 순간이다.
거울에 몸 전체를 비추려면 한 발짝 뒤로 크게 물러서야 하는 것처럼, ‘병원에서의 삶’은 거울을 딱 그 정도 거리에 두고 서 있는 것과 같다. 나의 삶 전체를 지그시 바라보는 일. 어쩌면 환자들과 함께했던 날들의 기록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조망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누구나 머잖은 미래에 맞닥뜨릴 일이다. 우리는 모두 시간과 함께 늙어가는 유한한 존재니까.
- 들어가는 말 중에서
환자들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사,
청진기를 내리고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기 시작하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환자를 만나면 숨소리부터 듣는다. 목이 잔뜩 쉬어 나는 거친 쇳소리, 가르랑가르랑 가래 끓는 소리, 색색거리며 좁아진 기관지 사이를 힘겹게 지나가는 바람 소리. 청진기를 대고 가만히 사람들의 숨을 듣는다. 그들이 깜박이는 생의 신호를 귀로 느낀다.
삶의 끝에 다다르면 호흡기에 이상이 감지된다. 숨을 쉰다는 건 생명 활동의 기본이므로. 그래서 호흡기 내과 환자들 중에는 죽음이 멀지 않은 분들이 많다. 오랜 투병 생활로 전신이 굳어버린 루게릭병 환자, 말기 암 환자, 노화로 점점 꺼져가는 촛불처럼 기운이 사위어가는 노인들. 모두들 똑같은 모습으로 절망하며 죽음이라는 선포된 결말에 갇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각자의 방식대로 예상된 죽음을 감내하고 사느라 크게 웃고,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면서 농담 주고받기 바쁘다. 의식의 수면 위로 톡톡 튀어오르는 환자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주치의였던 저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덕분에 그는 “유한한 삶을 가장 절실하게 자각하는 곳”인 병원의 일상을 기록하고 관찰하며 숨소리와 더불어 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죽음이 유폐된 사회,
우리는 왜 죽음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걸까?
한 남자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오열한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어서 고통 없는 하늘로 떠나셨으면 좋겠다던 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 콧물 쏙 빼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우는 걸까? 저자는 인간을 하나의 별에 비유하며 죽음이 주는 서글픔의 이유를 찾는다.
인간은 하나의 별과 같다. 별들이 서로 우주 안에서 관계 맺는 힘이 무게이듯 인간도 ‘중량감’이 있어야 궤도를 형성하고 중량감이 만든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별이 소실될 때 중력파를 남기듯 한 인간도 생을 마감할 때 파장을 남긴다. 누군가의 삶과 체취가 변형한 시공간에 익숙해진 주위 사람들의 세포가 고인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것이다._8쪽
아무리 세상살이가 공허한 우주 같아서 홀로 걸어간다지만 우리는 서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함께 당기고 미느라 엮이고 닿아 있다. 그래서 이별은 슬프다. 상대가 내게, 혹은 내가 상대에게 남긴 흔적이 남아 있는 한 죽음은 마냥 회피하고 싶은 ‘종말’일지 모른다. 하지만 끝없는 회피는 삶 속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하고 개인을 병들게 한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이 죽음 앞에 느끼는 공포가 더욱 극심하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철저히 유폐하기 때문이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을 겪지 않는 이상, 정신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 죽음은 없다. 급브레이크를 밟듯 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순간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의 갑작스런 비보는 그렇게 개인을 무너뜨린다.
저자는 “죽음이 전문화, 의료화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의학은 아프기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학문이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 탓에 저자는 의사가 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정작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는 교육받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의학 또는 의사야말로 “여전히 삶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관계 안에서 피어나는 생,
‘끝’이 있기에 모든 게 애틋하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짝 뒤따라 붙은 죽음 앞에 “가야 돼. 흙 요만치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땅에 보태야제.” 하며 웃어 보이는 할머니, 몇 십 년째 말없이 꼼짝 않고 누워 있는 “답답 박 서방”을 변함없이 사랑스럽게 부르는 아내, 몸이 뻣뻣하게 굳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일그러진 얼굴로 연신 선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는 환자. 때로는 그들도 예정된 결말에 눈물짓고 세상을 향해 “격정적인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나눠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며 행복해한다. 저자는 그들을 보며 “언젠간 반드시 들이닥칠 죽음이라는 단절이 주는 불안, 두려움, 허무, 공포는 현재의 삶을 잠식하고 주위 사람들 과 나누는 사랑, 애틋함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폐기”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생의 의지’에 주목한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기에 찰나가 더 소중한지도 모른다. 서로에 대한 애틋함은 무한을 펼칠 수 있는 유한한 삶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끝이 있는 삶 속에서 서로가 만난 게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병원에서의 삶을 기록하며 각자가 세상에 내린 뿌리, 관계로 묶인 매듭들을 돌아보며 죽음을 자연스럽게 삶 안에 장착하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그의 글은 순간의 작은 웃음과 곁에 자리 잡은 사람들과의 일상 같은 평범한 일들을 선물처럼 바꿔버린다.
회피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커져간다.
지금이야말로 잠시 멈춰 서서
서로의 존재를 감싸 안아야 하는 순간이다.
거울에 몸 전체를 비추려면 한 발짝 뒤로 크게 물러서야 하는 것처럼, ‘병원에서의 삶’은 거울을 딱 그 정도 거리에 두고 서 있는 것과 같다. 나의 삶 전체를 지그시 바라보는 일. 어쩌면 환자들과 함께했던 날들의 기록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조망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누구나 머잖은 미래에 맞닥뜨릴 일이다. 우리는 모두 시간과 함께 늙어가는 유한한 존재니까.
- 들어가는 말 중에서
환자들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사,
청진기를 내리고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기 시작하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환자를 만나면 숨소리부터 듣는다. 목이 잔뜩 쉬어 나는 거친 쇳소리, 가르랑가르랑 가래 끓는 소리, 색색거리며 좁아진 기관지 사이를 힘겹게 지나가는 바람 소리. 청진기를 대고 가만히 사람들의 숨을 듣는다. 그들이 깜박이는 생의 신호를 귀로 느낀다.
삶의 끝에 다다르면 호흡기에 이상이 감지된다. 숨을 쉰다는 건 생명 활동의 기본이므로. 그래서 호흡기 내과 환자들 중에는 죽음이 멀지 않은 분들이 많다. 오랜 투병 생활로 전신이 굳어버린 루게릭병 환자, 말기 암 환자, 노화로 점점 꺼져가는 촛불처럼 기운이 사위어가는 노인들. 모두들 똑같은 모습으로 절망하며 죽음이라는 선포된 결말에 갇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각자의 방식대로 예상된 죽음을 감내하고 사느라 크게 웃고,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면서 농담 주고받기 바쁘다. 의식의 수면 위로 톡톡 튀어오르는 환자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주치의였던 저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덕분에 그는 “유한한 삶을 가장 절실하게 자각하는 곳”인 병원의 일상을 기록하고 관찰하며 숨소리와 더불어 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죽음이 유폐된 사회,
우리는 왜 죽음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걸까?
한 남자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오열한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어서 고통 없는 하늘로 떠나셨으면 좋겠다던 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 콧물 쏙 빼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우는 걸까? 저자는 인간을 하나의 별에 비유하며 죽음이 주는 서글픔의 이유를 찾는다.
인간은 하나의 별과 같다. 별들이 서로 우주 안에서 관계 맺는 힘이 무게이듯 인간도 ‘중량감’이 있어야 궤도를 형성하고 중량감이 만든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별이 소실될 때 중력파를 남기듯 한 인간도 생을 마감할 때 파장을 남긴다. 누군가의 삶과 체취가 변형한 시공간에 익숙해진 주위 사람들의 세포가 고인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것이다._8쪽
아무리 세상살이가 공허한 우주 같아서 홀로 걸어간다지만 우리는 서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함께 당기고 미느라 엮이고 닿아 있다. 그래서 이별은 슬프다. 상대가 내게, 혹은 내가 상대에게 남긴 흔적이 남아 있는 한 죽음은 마냥 회피하고 싶은 ‘종말’일지 모른다. 하지만 끝없는 회피는 삶 속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하고 개인을 병들게 한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이 죽음 앞에 느끼는 공포가 더욱 극심하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철저히 유폐하기 때문이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을 겪지 않는 이상, 정신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 죽음은 없다. 급브레이크를 밟듯 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순간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의 갑작스런 비보는 그렇게 개인을 무너뜨린다.
저자는 “죽음이 전문화, 의료화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의학은 아프기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학문이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 탓에 저자는 의사가 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정작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는 교육받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의학 또는 의사야말로 “여전히 삶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관계 안에서 피어나는 생,
‘끝’이 있기에 모든 게 애틋하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짝 뒤따라 붙은 죽음 앞에 “가야 돼. 흙 요만치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땅에 보태야제.” 하며 웃어 보이는 할머니, 몇 십 년째 말없이 꼼짝 않고 누워 있는 “답답 박 서방”을 변함없이 사랑스럽게 부르는 아내, 몸이 뻣뻣하게 굳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일그러진 얼굴로 연신 선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는 환자. 때로는 그들도 예정된 결말에 눈물짓고 세상을 향해 “격정적인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나눠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며 행복해한다. 저자는 그들을 보며 “언젠간 반드시 들이닥칠 죽음이라는 단절이 주는 불안, 두려움, 허무, 공포는 현재의 삶을 잠식하고 주위 사람들 과 나누는 사랑, 애틋함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폐기”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생의 의지’에 주목한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기에 찰나가 더 소중한지도 모른다. 서로에 대한 애틋함은 무한을 펼칠 수 있는 유한한 삶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끝이 있는 삶 속에서 서로가 만난 게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병원에서의 삶을 기록하며 각자가 세상에 내린 뿌리, 관계로 묶인 매듭들을 돌아보며 죽음을 자연스럽게 삶 안에 장착하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그의 글은 순간의 작은 웃음과 곁에 자리 잡은 사람들과의 일상 같은 평범한 일들을 선물처럼 바꿔버린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