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소한 풍경
소소한 풍경

- 저자 :박범신
- 출판사 :자음과모음
- 출판년 :2014-05-1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6-30)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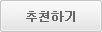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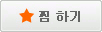
영원한 청년작가 박범신!
2014년 신작 장편소설 『소소한 풍경』
『은교』에서 이루지 못한 새로운 사랑 이야기!
불가능한 가능한, 사랑
한 남자와 두 여자,
정확히는 한 여자와 한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이 셋이 서로를 사랑한다.
도대체 이런 사랑도 가능한 것일까?
“생의 어느 작은 틈은 검푸른 어둠에 싸여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비밀’이다.”
가없이 슬프고 신비한 인간의 운명에 관한 보고서
우리 시대 영원한 청년작가 박범신이 ‘갈망 3부작’ ‘자본주의 폭력성을 비판한 3부작’ 이후 ‘논산집’ 호숫가를 쓸쓸히 배회하며 완성한 장편소설 『소소한 풍경』으로 돌아왔다.
『소소한 풍경』은 소설의 주인공이자 스승인 소설가 ‘나’의 제자인 ㄱ이 스승에게 간만에 전화를 걸어 난데없이 “시멘트로 뜬 데스마스크”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시작한다. 주인공 ㄱ은 어렸을 때 오빠와 부모를 차례로 잃었으며, 한때 작가를 지망했고 결혼에 실패한 여자로 지금은 ‘소소’시에 내려와 살고 있다. 남자인 ㄴ 또한 어렸을 때 형과 아버지가 모두 1980년 5월, 광주에서 살해당하고 어머니가 요양소에 가 있으며, 그 자신은 평생 떠돌이로 살아왔다. 또 다른 여자 ㄷ은 간신히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 처녀로, 그녀의 아버지는 국경을 넘다가 죽고 어머니는 그녀가 증오하는 짐승 같은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 자신은 조선족 처녀로 위장해 어머니에게 돈을 부쳐야 하는 고된 삶을 살다가 소소까지 찾아들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파르게 넘어온 자들이 소소에 머무르게 된다.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소소한 풍경』에서 펼쳐진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유한에서 불멸로의 이행
그것은 끝인가, 시작인가, 아니면 에로티시즘의 완결인가
도대체 이런 사랑도 가능한 것일까.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있다. 정확히는 한 여자와 한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 이 셋이 서로를 사랑한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한 여자가 다른 여자와 그리고 셋이서 함께.
『소소한 풍경』은 일반적 사랑의 서사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 소설에는 두 여자와 한 남자가 등장하지만,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한 여자가 남자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번민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 소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은 모두 셋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 오직 둘만 있다. 독특하고 이상한 사랑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사랑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혹시 인간의 본질적 운명에 대해 매우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름답고 신비한 소설의 함의를 너무 한정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소소한 풍경』에는 작가 박범신의 독특한 소설론과 함께 삶과 죽음, 존재의 시원, 사랑과 욕망에 따른 인간 본질의 최저층에 대한 박범신만의 특별한 인식론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예민한 상상력을 통해 제자와 그녀가 겪은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박범신의 신작 장편소설 『소소한 풍경』이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소소한 풍경이면서 결코 소소한 풍경이 아니다. 불가사의하고 슬프고 찬란하고 위험하다. 이 소설을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읽든,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읽든, 존재의 시원에 관한 이야기로 읽든, 사랑의 불가사의하고 신비하고 위험한 근본적 꿈에 관한 이야기로 읽든, 그 후에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 소설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생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미완성의 작가’라 불러달라는 박범신의 다음 소설은 또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줄거리
ㄱ은 어느 날 낡은 다세대주택 앞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ㄴ을 발견한다. 그는 집주인에게 억울하게 내쫓긴 세입자로 자신의 몸속에 남아 있는 힘을 모조리 빼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다. “죽고 싶으세요? 물구나무서기론 절대 안 죽어요!” 혼자 사는 ㄱ은 ㄴ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다. 커다란 더플백 하나를 짊어지고 들어온 ㄴ은 언제든 곧 떠날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자신에게 알 수 없는 만족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둘이 사니 더 좋네!”
어느 날, 농기구점에 들른 둘은 삽 세 자루를 사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날부터 ㄴ은 ㄱ의 집 뒤란에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여자는 우물이라고 하고, 남자는 샘이라고 했다. 샘을 판다는 것은 ㄴ이 한동안 ㄱ의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ㄷ이 그들이 사는 곳에 온 것은 우물이 완성될 즈음이었다. ㄴ은 어린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ㄱ의 집에 들이면 안 될 것이라고 예감한다. 하지만 ㄱ는 ㄴ의 뜻을 거부한다. ㄷ은 자신에게 마음을 연 ㄱ의 집에서 스스럼없이 자리를 잡아간다. ㄷ이 먼저 마음을 붙인 것은 ㄱ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ㄴ도 ㄷ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ㄱ와 ㄴ, ㄴ와 ㄷ, ㄱ과 ㄴ, ㄷ은 마치 ‘덩어리지듯’ 서로에게 뒤섞여든다. “셋이 사는 것도 참 좋네!”
ㄴ의 우물 파기가 완성된 날, ㄱ과 ㄴ, ㄷ은 우물에서 나오는 첫 물을 마시며 밤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ㄱ은 우물 앞에 앉은 ㄴ을 발견한다. 그는 우물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그의 등으로 햇빛이 산란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ㄷ이 ㄴ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 있었다.
형사는 ㄱ의 집터에서 발견된 남자의 데스마스크에 관해 추궁했다. 그 데스마스크는 일반적인 경우인 석고가 아닌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른 데스마스크들이 죽음의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반면 이 데스마스크의 표정은 담담했다.
ㄱ은 대학 시절 「우물」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그녀의 동료들은 “이게 소설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악평했지만, ‘선생님’만은 몽환적인 그 소설이 지닌 힘을 감지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선생님은 ㄱ이 걸어온 전화를 받는다. “시멘트로 뜬 데스마스크 보셨어요?”
ㄱ에게 ㄴ은 언제나 물구나무를 서는 남자, 우물을 파는 남자였을 뿐이다.
작가의 말
(……)
생의 어느 작은 틈은 여전히 검푸른 어둠에 싸여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비밀’이다. 작가인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인물들이 최종적으로 그리워한 지점도 그럴 것이다.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족에게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읽고 나선 부디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주기 바란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졌을지 모르는 불멸에의 꿈도 그렇다. 감히 ‘비밀’의 봉인을 열고자 한 나에게 죄 있을진저.
2014년 신작 장편소설 『소소한 풍경』
『은교』에서 이루지 못한 새로운 사랑 이야기!
불가능한 가능한, 사랑
한 남자와 두 여자,
정확히는 한 여자와 한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이 셋이 서로를 사랑한다.
도대체 이런 사랑도 가능한 것일까?
“생의 어느 작은 틈은 검푸른 어둠에 싸여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비밀’이다.”
가없이 슬프고 신비한 인간의 운명에 관한 보고서
우리 시대 영원한 청년작가 박범신이 ‘갈망 3부작’ ‘자본주의 폭력성을 비판한 3부작’ 이후 ‘논산집’ 호숫가를 쓸쓸히 배회하며 완성한 장편소설 『소소한 풍경』으로 돌아왔다.
『소소한 풍경』은 소설의 주인공이자 스승인 소설가 ‘나’의 제자인 ㄱ이 스승에게 간만에 전화를 걸어 난데없이 “시멘트로 뜬 데스마스크”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시작한다. 주인공 ㄱ은 어렸을 때 오빠와 부모를 차례로 잃었으며, 한때 작가를 지망했고 결혼에 실패한 여자로 지금은 ‘소소’시에 내려와 살고 있다. 남자인 ㄴ 또한 어렸을 때 형과 아버지가 모두 1980년 5월, 광주에서 살해당하고 어머니가 요양소에 가 있으며, 그 자신은 평생 떠돌이로 살아왔다. 또 다른 여자 ㄷ은 간신히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 처녀로, 그녀의 아버지는 국경을 넘다가 죽고 어머니는 그녀가 증오하는 짐승 같은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 자신은 조선족 처녀로 위장해 어머니에게 돈을 부쳐야 하는 고된 삶을 살다가 소소까지 찾아들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파르게 넘어온 자들이 소소에 머무르게 된다.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소소한 풍경』에서 펼쳐진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유한에서 불멸로의 이행
그것은 끝인가, 시작인가, 아니면 에로티시즘의 완결인가
도대체 이런 사랑도 가능한 것일까.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있다. 정확히는 한 여자와 한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 이 셋이 서로를 사랑한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한 여자가 다른 여자와 그리고 셋이서 함께.
『소소한 풍경』은 일반적 사랑의 서사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 소설에는 두 여자와 한 남자가 등장하지만,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한 여자가 남자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번민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 소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은 모두 셋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 오직 둘만 있다. 독특하고 이상한 사랑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사랑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혹시 인간의 본질적 운명에 대해 매우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름답고 신비한 소설의 함의를 너무 한정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소소한 풍경』에는 작가 박범신의 독특한 소설론과 함께 삶과 죽음, 존재의 시원, 사랑과 욕망에 따른 인간 본질의 최저층에 대한 박범신만의 특별한 인식론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예민한 상상력을 통해 제자와 그녀가 겪은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박범신의 신작 장편소설 『소소한 풍경』이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소소한 풍경이면서 결코 소소한 풍경이 아니다. 불가사의하고 슬프고 찬란하고 위험하다. 이 소설을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읽든,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읽든, 존재의 시원에 관한 이야기로 읽든, 사랑의 불가사의하고 신비하고 위험한 근본적 꿈에 관한 이야기로 읽든, 그 후에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 소설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생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미완성의 작가’라 불러달라는 박범신의 다음 소설은 또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줄거리
ㄱ은 어느 날 낡은 다세대주택 앞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ㄴ을 발견한다. 그는 집주인에게 억울하게 내쫓긴 세입자로 자신의 몸속에 남아 있는 힘을 모조리 빼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다. “죽고 싶으세요? 물구나무서기론 절대 안 죽어요!” 혼자 사는 ㄱ은 ㄴ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다. 커다란 더플백 하나를 짊어지고 들어온 ㄴ은 언제든 곧 떠날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자신에게 알 수 없는 만족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둘이 사니 더 좋네!”
어느 날, 농기구점에 들른 둘은 삽 세 자루를 사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날부터 ㄴ은 ㄱ의 집 뒤란에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여자는 우물이라고 하고, 남자는 샘이라고 했다. 샘을 판다는 것은 ㄴ이 한동안 ㄱ의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ㄷ이 그들이 사는 곳에 온 것은 우물이 완성될 즈음이었다. ㄴ은 어린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ㄱ의 집에 들이면 안 될 것이라고 예감한다. 하지만 ㄱ는 ㄴ의 뜻을 거부한다. ㄷ은 자신에게 마음을 연 ㄱ의 집에서 스스럼없이 자리를 잡아간다. ㄷ이 먼저 마음을 붙인 것은 ㄱ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ㄴ도 ㄷ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ㄱ와 ㄴ, ㄴ와 ㄷ, ㄱ과 ㄴ, ㄷ은 마치 ‘덩어리지듯’ 서로에게 뒤섞여든다. “셋이 사는 것도 참 좋네!”
ㄴ의 우물 파기가 완성된 날, ㄱ과 ㄴ, ㄷ은 우물에서 나오는 첫 물을 마시며 밤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ㄱ은 우물 앞에 앉은 ㄴ을 발견한다. 그는 우물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그의 등으로 햇빛이 산란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ㄷ이 ㄴ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 있었다.
형사는 ㄱ의 집터에서 발견된 남자의 데스마스크에 관해 추궁했다. 그 데스마스크는 일반적인 경우인 석고가 아닌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른 데스마스크들이 죽음의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반면 이 데스마스크의 표정은 담담했다.
ㄱ은 대학 시절 「우물」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그녀의 동료들은 “이게 소설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악평했지만, ‘선생님’만은 몽환적인 그 소설이 지닌 힘을 감지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선생님은 ㄱ이 걸어온 전화를 받는다. “시멘트로 뜬 데스마스크 보셨어요?”
ㄱ에게 ㄴ은 언제나 물구나무를 서는 남자, 우물을 파는 남자였을 뿐이다.
작가의 말
(……)
생의 어느 작은 틈은 여전히 검푸른 어둠에 싸여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비밀’이다. 작가인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인물들이 최종적으로 그리워한 지점도 그럴 것이다.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족에게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읽고 나선 부디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주기 바란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졌을지 모르는 불멸에의 꿈도 그렇다. 감히 ‘비밀’의 봉인을 열고자 한 나에게 죄 있을진저.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